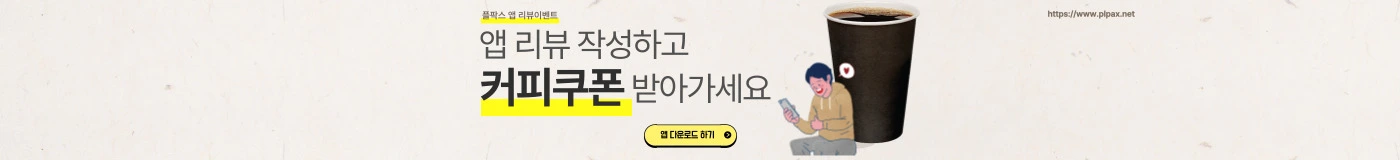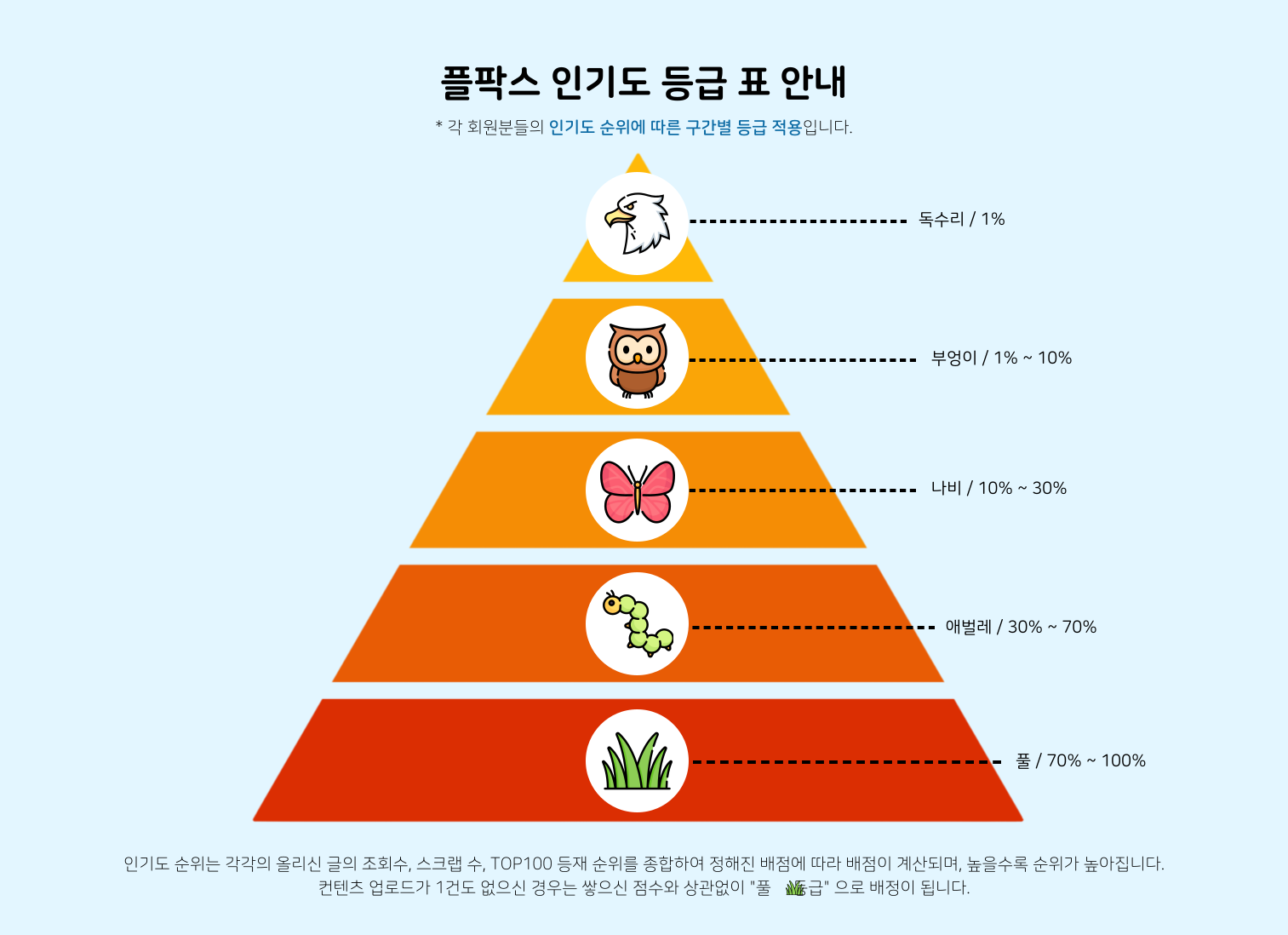나는 2018년 말에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다. 길고 무서운 약세장이 지나간 후에 들어왔으니 초기에는 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2019년은 증시 자체가 거의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던 시기였고(여름쯤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짧은 급락장이 나왔던 시기를 제외하면)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쏠쏠한 재미를 느꼈던 시간이었기도 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귀여울 뿐이지만 이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수익률이 괜찮은데 수 년이 지나면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지 않을까?'
안전한 종목(적어도 흑자는 나는 종목)들을 추린 후 차트 상 지지선에 있는 주식을 사고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파는 매매를 반복하면서 나는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쌓일수록 수익률도 당연히 더 높아질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주식을 오래 한다고 해서 수익률도 그에 비례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 3~4년차 쯤에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집행한 투자건들이 많아지고 시장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많은 지식들을 축적하고 노이즈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나면서 나만의 투자철학이 정립되어왔다.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투자철학 역시 변할 것이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생각하게 되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졌듯이 지금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래에는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은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테니까.
투자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나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투자가 매우 편해졌다는 점이다. 더 똑똑해져서 종목을 고르기 쉬워지고 주식을 사고 팔 지점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주가의 변동에 무덤덤해지고 시장에서의 여러 노이즈들을 상당 부분 쳐내다보니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특히 비중이 높은 종목의 주가가 올라주면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오르다가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올랐네? 주가가 떨어졌네?' 정도만 생각할 뿐, 목표주가 근처까지 오른 것이 아닌 이상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당장 팔 것도 아닌데 주가가 오른다고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며, 다시 떨어진다고 허탈해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테마를 타고 오르는 종목들을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었다(주가가 오른 종목을 기피하는 내 성향이 한 몫 하기도 했지만). 전에는 '도대체 저런 종목들을 왜 저렇게 사는거야? 이런 식이면 내 종목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대체 내 껀 왜?' 라고 생각하며 대중들의 어리석음에 가끔 혼자 부글부글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어차피 때가 되면 내 종목에게도 기회가 온다. 그리고 그렇게 테마를 쫓는 사람들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시세가 나기도 하고 비효율이 발생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그래서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오래 투자를 하다보면 저절로 몸에 배는 것이 바로 이 침착함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시장은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미국같은 선진 시장에 비해 더 투기적일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의 수준, 경영자들의 수준, 자본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수준이 모두 낮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성숙해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성숙도는 더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선진 시장 같은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성숙도 역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싸이클을 그리며 올라가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이번 밸류업 정책이 단순 총선용,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투자자, 기업, 정부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인식하면서 장기성장의 과실을 얻고자 하고, 기업 경영자들은 주주를 호구로 보지 않으며, 정부는 공정한 투자의 장을 만들기 위해 애쓰기를.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