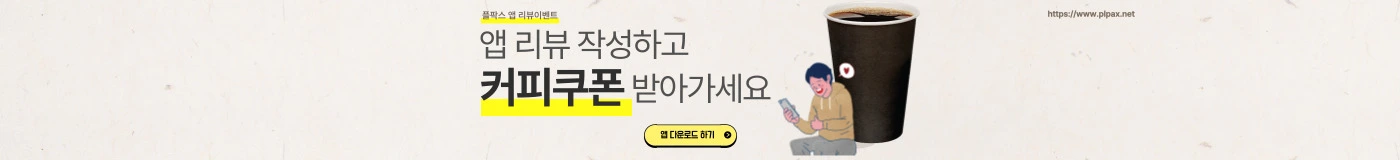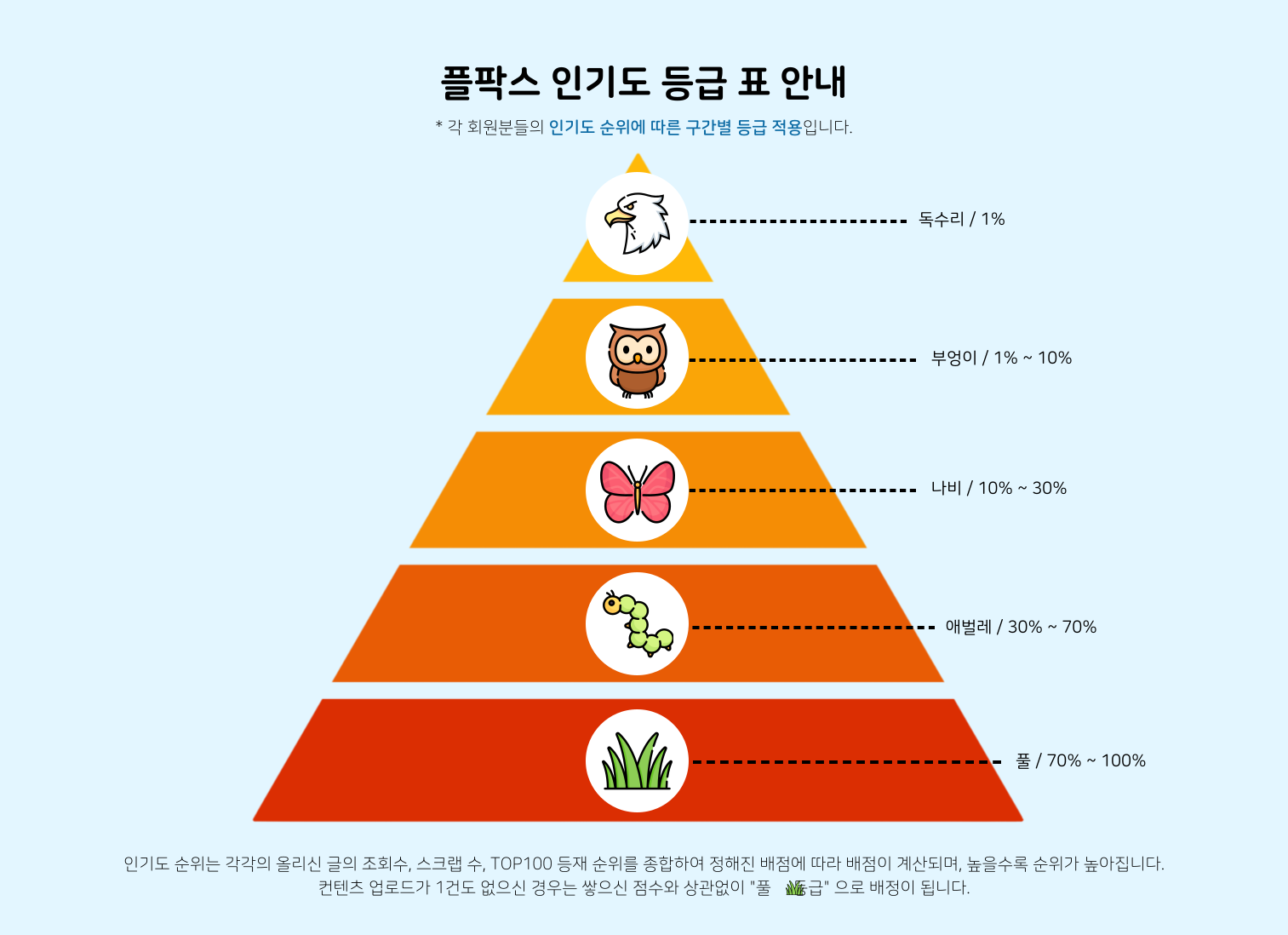우리는 투자자이든 소비자이든 ‘투명성’을 좋은 가치로 배워왔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마진이 몇 퍼센트인지,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왔는지. 숫자가 많을수록, 설명이 자세할수록 기업은 신뢰할 만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산업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전략을 택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은 일부러 숫자를 많이 말하지 않고, 사업 구조를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으며, 외부에서 정확한 실적 그림을 그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기업일수록 협상 테이블에서는 강합니다.
해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방산·항공·엔지니어링 쪽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업이 Lockheed Martin입니다. 록히드마틴은 매출 규모나 수주 잔고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아니지만, 개별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단가 구조,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낍니다. 특히 정부와 장기 계약을 맺는 구조에서는 숫자를 자세히 드러내는 순간, 그 숫자가 바로 협상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 정도 남기고 있네”라는 인식이 생기면, 다음 계약에서 가격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투명성을 법과 규제의 범위까지만 유지하고, 그 이상은 전략적으로 닫아둡니다. 결과적으로 외부에서는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정확히 모델링하기 어렵고,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협상력으로 작동합니다.
비슷한 결의 기업으로 ASML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SML은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장비 한 대당 실제 마진, 고객별 가격 조건, 유지보수 계약 구조 등은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을 봐도 기술 로드맵과 산업 전망 이야기는 많은 반면, 숫자는 매우 거칠게 제시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객이 단 한 곳뿐인 수준의 독점 사업에서는, 숫자가 곧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많을 때는 투명성이 신뢰를 만드지만, 고객이 적을수록 투명성은 협상력을 깎아먹습니다.
미국의 산업용 서비스 기업들에서도 이런 전략은 흔합니다. Moody's 같은 신용평가사는 전체 매출 규모는 공개하지만, 특정 고객군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어떤 계약이 얼마나 남는지는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평가라는 서비스 자체가 신뢰와 권위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부 숫자가 외부로 노출되는 순간 서비스의 ‘가격’이 아니라 ‘값어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숫자보다 위치를 관리하는 기업에 가깝습니다.
이제 국내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시 문화와 투자자 요구가 강하다 보니 이런 기업들이 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전력기술 같은 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수주 금액은 공개하지만, 프로젝트별 수익성이나 내부 원가 구조는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래서 돈을 버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불투명성이 발주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합니다. 만약 프로젝트 하나하나의 마진이 공개된다면, 다음 입찰에서 가격 경쟁은 훨씬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흥행 이후에도, 국가별·채널별 세부 수익 구조를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매출 성장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디에서 얼마나 남기는지는 모호합니다. 이건 단순히 공시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유통사·파트너·현지 법인과의 관계에서 숫자가 곧 협상 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유통 구조에서는 내부 숫자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순간, 조건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투자자 친화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대신, 거래 상대방과의 힘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숫자를 많이 공개하면 투자자는 편해지지만, 고객과 파트너는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숫자를 최소한으로 공개하면, 투자자는 답답해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B2B, 인프라, 장기 계약 산업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략이 모든 기업에 통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비재, 플랫폼, 구독 기반 서비스처럼 고객이 다수이고 전환 비용이 낮은 산업에서는 투명성이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고객 수가 제한적이고, 계약 단위가 크며, 관계가 길어질수록 힘이 쌓이는 산업에서는 오히려 ‘덜 말하는 것’이 전략이 됩니다. 시장은 이 차이를 자주 놓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늘 “애매하다”, “가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 지점이 꽤 불편합니다. 숫자가 없으니 모델을 만들기 어렵고, 확신을 갖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왜 굳이 모든 숫자를 외부에 설명해야 할까요. 내부에서 충분히 통제되고 있고, 협상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금이 돌고 있다면, 그 기업은 굳이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주제는 투명성에 대한 맹신을 한 번쯤 의심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많이 보여주는 기업이 항상 좋은 기업은 아니고, 숫자를 숨기는 기업이 항상 위험한 기업도 아닙니다. 어떤 기업은 숫자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버티고, 더 유리한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런 기업을 이해하려면 분기 실적보다 산업 구조와 거래 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기업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