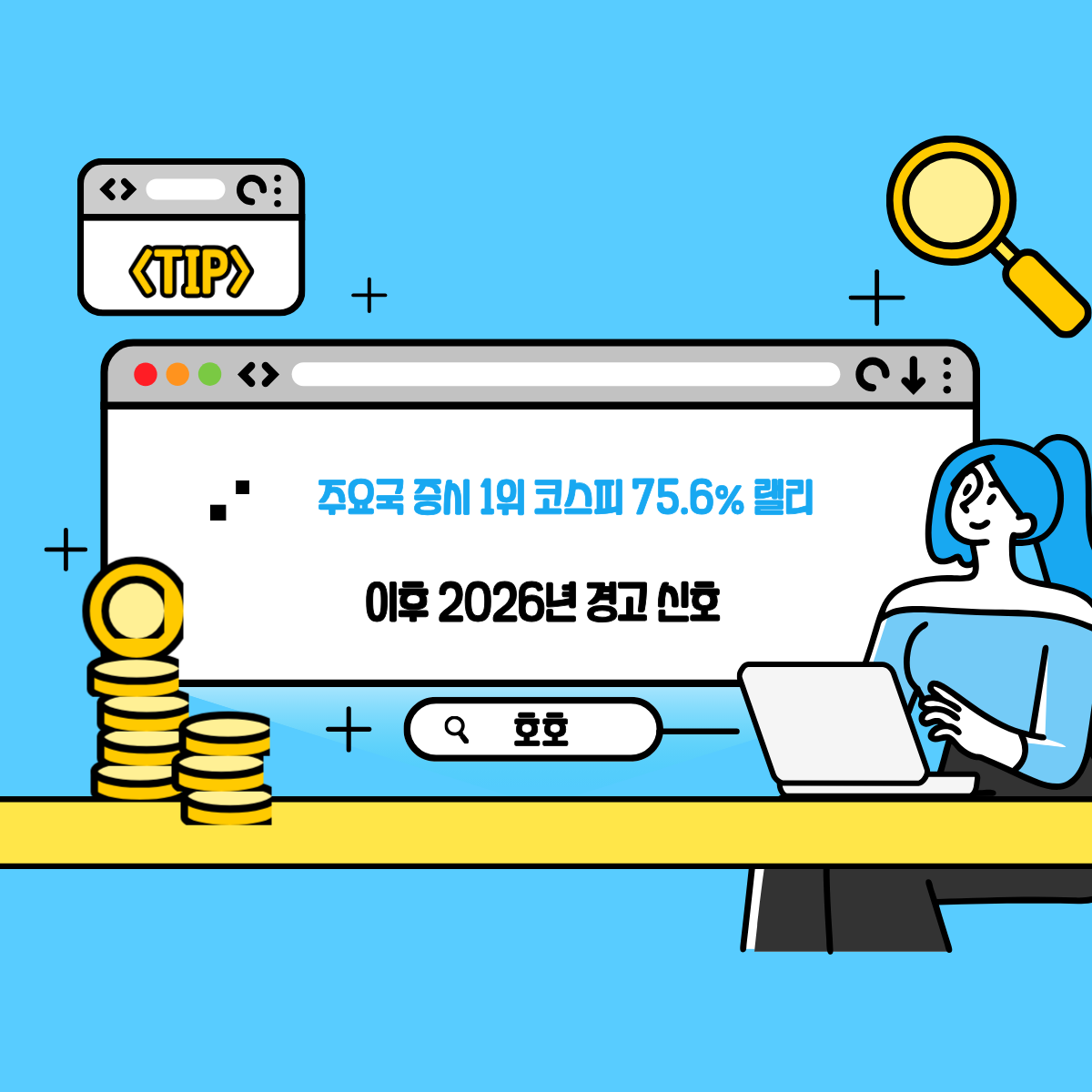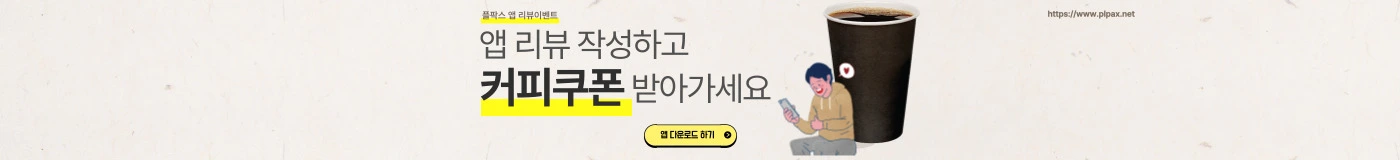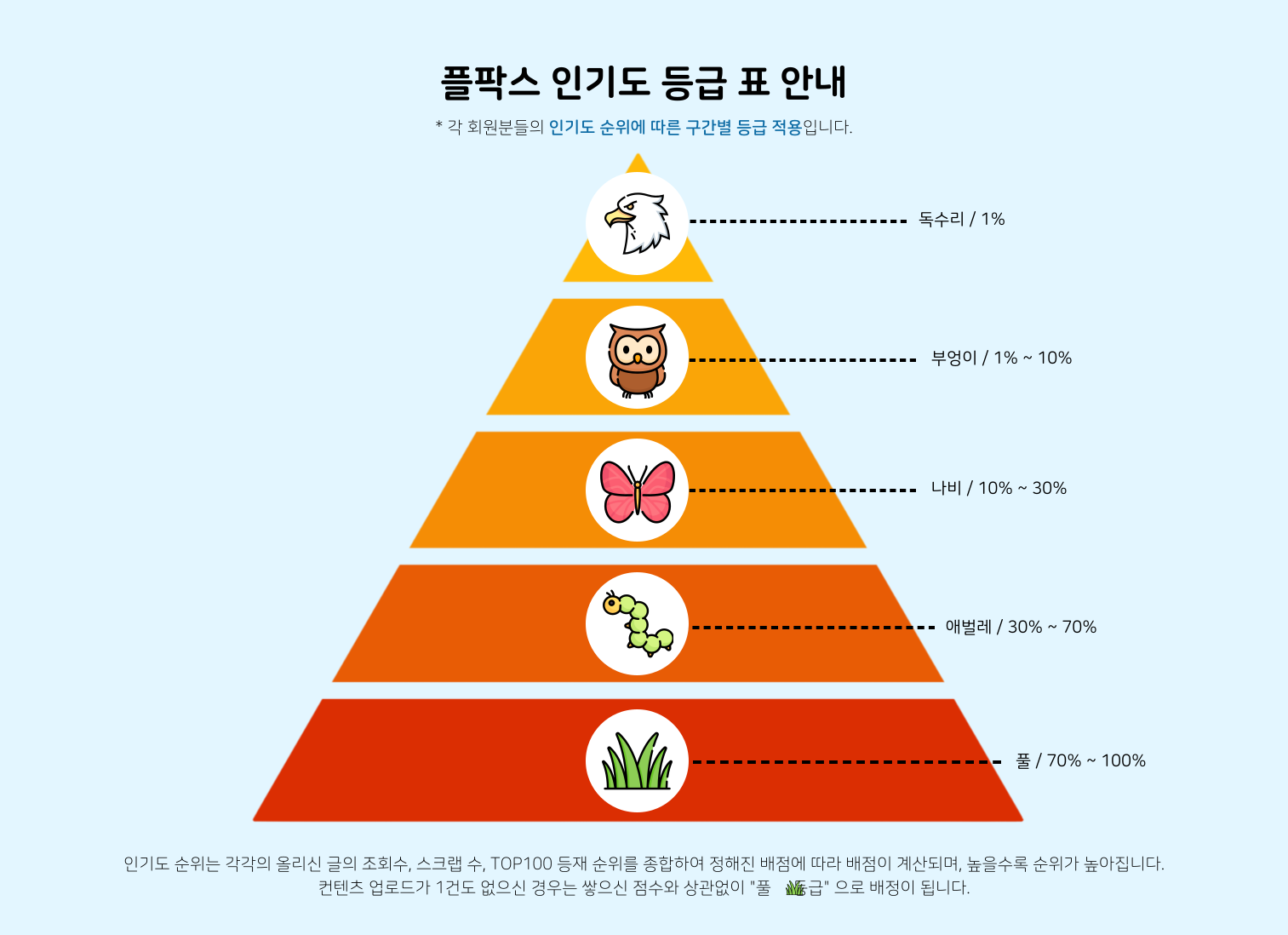코스피가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75.6%나 오르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화려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앞둔 지금, 분위기를 마냥 낙관하기엔 마음 한켠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리, 정책, 기업 실적이라는 새로운 변수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impressive한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전광판이 잘못된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온 이유
12월 30일, 장 마감 숫자 4,214.17을 처음 봤을 때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게 맞아?”라는 반응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연초엔 불안이 가득했고,
4월 9일에는 코스피가 2,293까지 밀리며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뉴스만 켜면 “오늘도 변동성 확대”라는 말이 따라붙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년 말 2,399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75.6% 상승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75.6% 상승’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숫자로 딱 증명된 결과였던 셈입니다.
“1위”라는 말, 정확히 어디서 1위일까?
여기서 한 번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1위는 전 세계 모든 시장을 통틀어 1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G20·OECD 등 주요국 지수와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뜻입니다.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뚜렷합니다.
2위로 언급되는 칠레가 약 57% 수준이었고, 일본은 27%,
중국은 18%, 미국은 17%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올해 한국 증시가 유독 뜨거웠다”는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강렬할수록 마음은 쉽게 들뜹니다. 그래서 내년을 바라볼 땐,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왜 올랐는지를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93에서 4,214까지, 반전의 이유는?
올해의 반전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세 가지로 줄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책, 업황, 그리고 심리.
연초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변수, 특히 통상 리스크 같은 요인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업황 회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의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기대’가 ‘이제는 믿어볼 만하다’는 분위기로 변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퍼지는 속도가 더 빠를 때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올해 코스피가 딱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시가총액 3,478조, 돈의 크기가 달라졌다
체감상 “정말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3,478조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넘어섰고,
전년 대비 77.1%나 증가했습니다. 시장 자체의 덩치가 한 단계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거래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5억 1,800만 주로 전년 대비 6.4% 늘었는데,
거래대금은 16조 9,000억 원으로 무려 57.1% 증가했습니다.
주식이 엄청 더 많이 오간 건 아닌데, 움직인 돈의 크기가 훨씬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대형주·고가주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달아오를수록, 말보다 가격이 먼저 반응합니다.
왜 기계·장비와 전기·전자가 주도했을까?
올해는 전 업종이 상승했지만, 특히 눈에 띈 곳은 기계·장비(+133.7%), 전기·전자(+127.9%)였습니다.
전기·가스, 증권 업종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조합은 꽤 전형적입니다.
성장 기대가 있는 업종, 투자 사이클이 붙는 업종, 그리고 시장이 뜨거울수록 수혜를 보는 업종이 동시에 강해졌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돈이 몰리면 업종이 먼저 웃고, 뉴스는 나중에 따라온다”는 말이 올해도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외국인·기관 수급이 던지는 힌트
수급을 보면 시장이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 기관과 기타법인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대규모 순매수로 상승 흐름을 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외국인은 늘 사고파는 존재가 아니라, 살 이유가 생기면 크게 산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으려면, 실적의 연속성, 정책의 지속성, 대외 변수 완화 같은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코스닥도 조용하지 않았다
코스닥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수는 925.47, 시가총액은 506조 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하반기 회복이 인상적이었고, 4분기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성장주는 늘 그렇듯 기대가 큰 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2026년에는 ‘이야기가 좋은 기업’보다 숫자로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더 편안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IPO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수는 줄었지만 공모금액은 늘었습니다. 숫자는 줄어도, 한 건 한 건이 더 굵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026년, 저는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내년을 전망할 때 저는 지수 맞히기보다 변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첫째,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올해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투자 심리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 둘째, 금리 환경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은 주식시장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입니다.
- 셋째, 실적의 연속성입니다. 이벤트성 호재가 아니라, 숫자로 이어지는 실적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무엇이 더 오를까?”가 아니라,
“무엇이 덜 흔들리며 끝까지 남을까?”
2026년은 지수보다도 기업의 현금 흐름, 주주환원, 그리고 설명 가능한 경영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누구나 올라타지만, 식어갈 때 끝까지 남는 건 늘 체력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