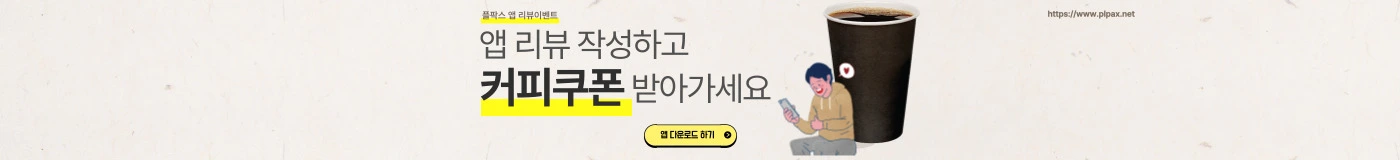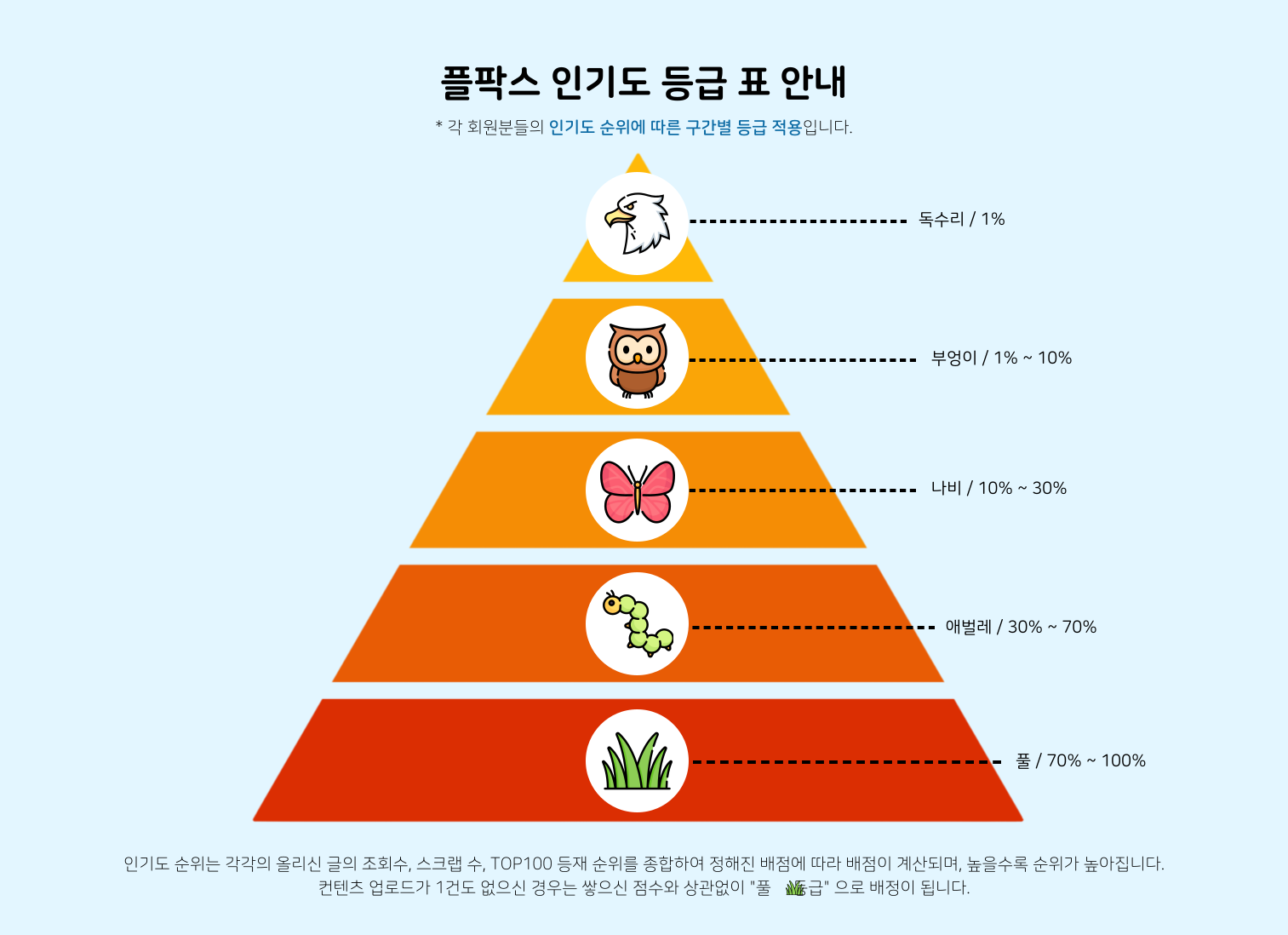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 증시에서 보기 드문 기업입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일 때마다 늘 같은 평가가 반복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살아 있다”, “항상 뉴스에 나오지만 막상 손대기는 애매하다”, “좋은 이야기와 나쁜 기억이 동시에 떠오른다”. 이런 반응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단순한 사이클 기업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언제나 시대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만큼 가장 먼저 흔들렸으며, 동시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별 사업이나 최근 뉴스보다 먼저 두산이라는 그룹의 흐름부터 짚어야 합니다. 두산그룹은 한국 재벌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신을 거듭한 그룹 중 하나입니다. 소비재에서 출발해 중공업으로, 다시 에너지와 인프라로 중심축을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회사가 과거의 두산중공업, 현재의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룹 확장의 엔진이었고, 동시에 그룹 위기의 진원지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두산그룹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몸집을 키웠습니다. 중공업, 건설기계, 발전 설비 등으로 영역을 넓혔고, 당시 두산중공업은 국내 발전 설비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전과 화력 발전이라는 국가 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수주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장은 대부분 차입을 동반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고속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외형은 커졌지만 현금흐름의 탄력성은 점점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전형적인 프로젝트 기반 기업입니다. 대형 설비를 수주하면 매출 인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금 회수 역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매출 규모는 크지만 현금흐름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정책 변수까지 겹치면, 리스크는 급격히 확대됩니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던 시기, 두산중공업의 사업 구조는 한순간에 취약해졌고, 이 부담은 그룹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전후,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무 상태는 위기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부채비율은 300%를 넘나들었고, 차입금 규모는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급감했고, 일부 사업에서는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회사는 구조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평가가 공공연히 나왔고, 두산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 기업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선택한 길은 확장의 포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정의였습니다. 더 이상 모든 에너지 영역을 다 끌어안는 회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집중하는 회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했으며, 그룹 차원에서도 무리한 확장을 중단했습니다. 이 과정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두산에너빌리티의 숫자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매출 규모만 보면 과거보다 줄어든 구간도 있지만, 수주 잔고와 사업 포트폴리오는 훨씬 안정적인 형태로 재편됐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단기 매출이 아니라, 중장기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는 미래 몇 년간의 매출과 현금흐름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수주 잔고를 다시 쌓아 올리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사업별로 보면 변화는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원전입니다. 원전은 한동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산업적으로도 침체 국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그리고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형 설비를 제작하고, 규제와 안전 기준을 통과시키며, 장기간 운영과 유지보수를 수행해본 경험이 핵심입니다. 이런 경험은 단기간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바로 이 경험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입니다. 이 점이 원전 산업이 다시 논의될 때마다, 이 회사가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SMR은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분산형 전원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장기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영역에서 핵심 부품과 제작 역량을 확보하며, 시장이 열릴 경우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해 두었습니다. 이는 당장 실적을 끌어올리는 요소라기보다는, 회사의 장기 옵션 가치를 높여주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가스터빈 사업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영역입니다. 가스터빈은 단가가 높고, 설치 이후에도 수십 년간 유지보수와 개보수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초기 납품 이후에도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의 현금흐름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출력 조절이 가능한 가스터빈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전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분야에서 국산화와 기술 내재화를 진행해 왔고, 이는 단순한 사업 기회를 넘어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단기간에 화려한 실적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사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수소 사업은 여전히 기대와 현실 사이에 있는 영역입니다. 수소는 미래 에너지로 자주 언급되지만, 상용화 속도는 예상보다 느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분야에서 보여주는 전략은 비교적 보수적입니다. 수소를 단독 성장 엔진으로 과대 포장하지 않고, 기존 발전 설비와 결합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대신, 성공했을 때의 폭발력도 제한하는 전략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점이 신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나의 미래에 모든 것을 거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 갈래의 에너지 전환 경로를 동시에 보유하고, 그중 어느 하나가 본격화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느리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늘 시장에서 늦게 평가받습니다.
왜 이런 기업은 항상 재평가가 늦을까요. 이유는 투자 심리에 있습니다. 시장은 빠른 성장과 즉각적인 숫자를 선호합니다. 반면 인프라 기업의 변화는 계약서, 공정표, 수주 잔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뉴스로 한 번에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두산에너빌리티는 과거의 위기 경험이 투자자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구조조정, 유상증자, 정책 리스크라는 단어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기억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고, 지금은 살아남은 구조를 다듬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가가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회사, 왜 아직 남아 있지?” 그 질문이 숫자와 수주, 사업 구조로 답을 얻는 순간, 재평가는 시작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바라볼 때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과거 산업의 잔재일까요, 아니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다시 쓰일 인프라 기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기 주가가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은 늘, 시장의 관심이 가장 적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를 끝내놓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