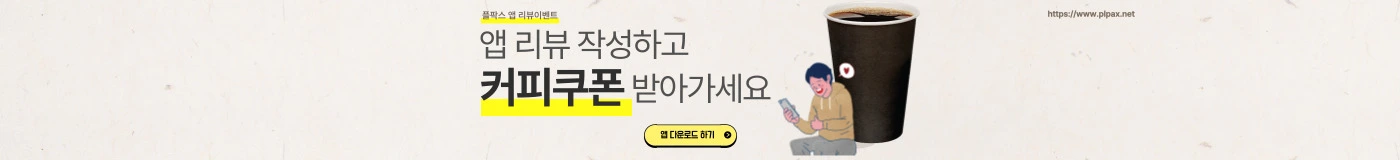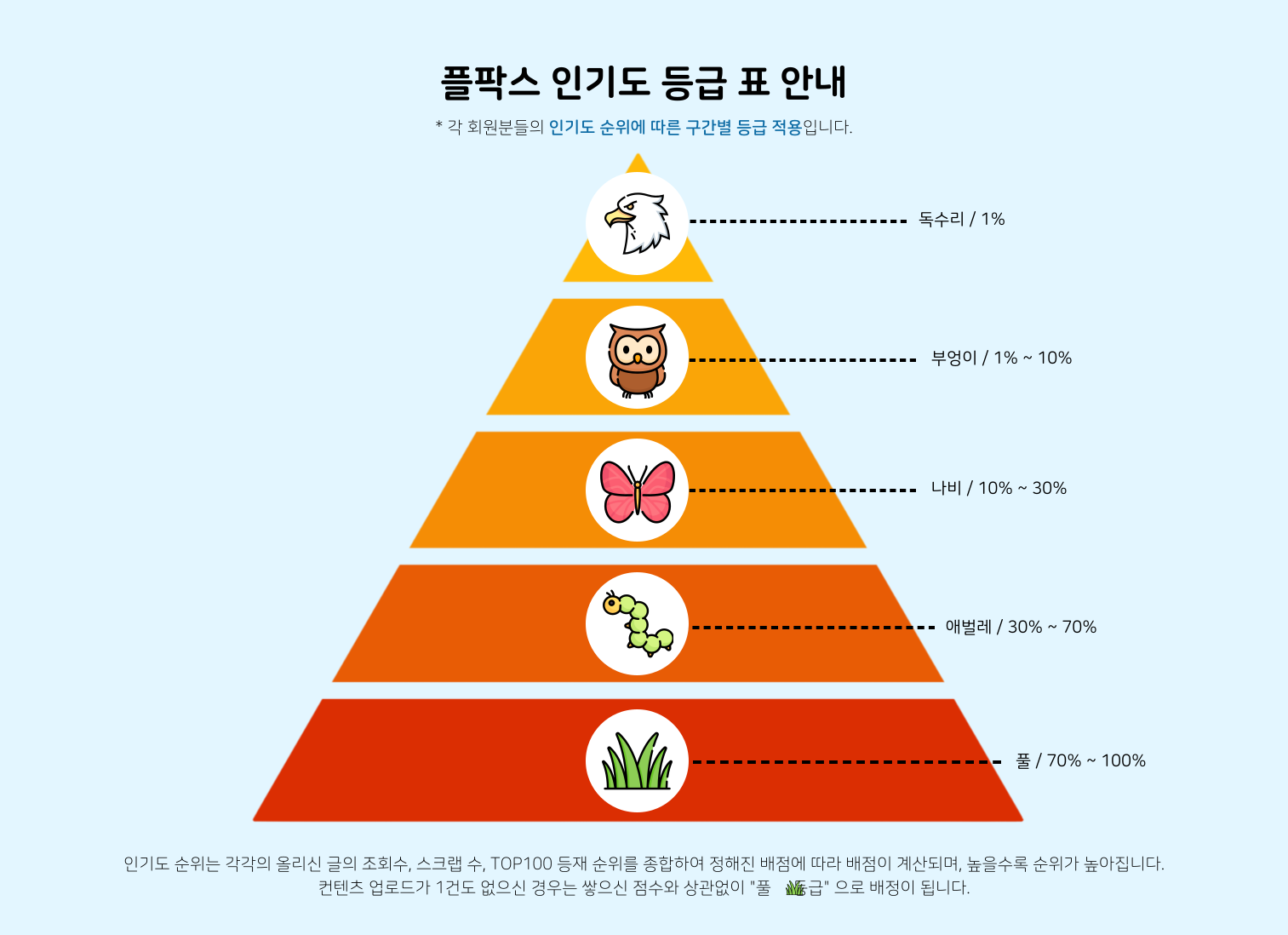안녕하세요. 최근 외환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한때 1,479.9원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1,500원을 돌파한다면 무려 17년 만의 일이 됩니다.
오늘은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는 사실을 넘어, 이것이 기업들에게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환율 1,500원이 갖는 진짜 의미: '녹인(Knock-In)'의 공포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다는 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기업들이 은행과 맺은 'FX 트리거(환율 조건부) 계약'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업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헤지) 은행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환율이 특정 가격(예: 1,500원) 이상 오르면 오히려 기업이 손해를 감수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금융 용어로 '녹인(Knock-In, 손실 구간 진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당수 계약의 기준선이 바로 '1,500원' 안팎에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500원을 넘서는 순간, 환 리스크를 막으려던 계약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기업의 현금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구조입니다.
현재 외국계 은행 두 곳에만 이런 계약 잔액이 약 662억 원에 달하고, 전체 금융권으로 넓히면 수천억 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금융권의 입장 "키코(KIKO) 때와는 다르다"
일각에서는 2000년대 후반 수많은 중소기업을 도산시켰던 '키코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과거 키코는 환율이 오를 때 기업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레버리지(배수)' 구조였지만, 현재의 상품들은 그런 독소 조항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험의 크기가 과거만큼 파괴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
금융권의 설명대로 상품 구조가 과거 키코 사태 때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위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첫째, '속도'와 '심리'의 문제입니다. 구조가 다르더라도 환율이 급등하여 임계점을 넘으면, 기업은 낮은 환율로 달러를 매도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덜 위험한 독'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타격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님의 지적처럼, 수출 기업은 그나마 버틸 체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수 중심이거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은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과 파생상품 손실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 수치를 넘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시험하는 구간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하신 종목 중 '외화 부채가 많거나', '파생상품 계약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리스크 점검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거를 복기(復棋)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시장의 신호를 예민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