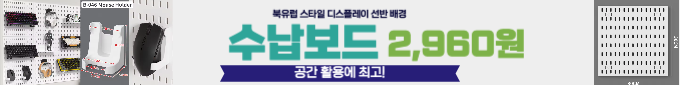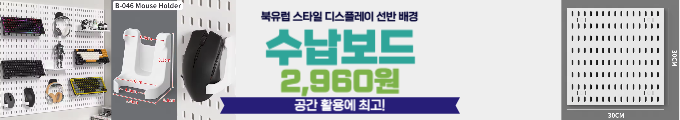요즘 글로벌 럭셔리 시장을 보면, 한때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산업’처럼 보였던 시절은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환경, 중국과 미국의 소비 변화, 각 브랜드의 전략 차이가 겹치면서 브랜드 간 실적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흐름을 보면, 브랜드 가치와 희소성이 견고한 기업들은 오히려 새로운 최고치를 찍었고, 반대로 브랜드 재정비가 필요한 기업들은 역성장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초호황과 침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럭셔리 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파편화된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약 80억 유로, 영업이익이 33억 유로를 넘어서며 영업이익률 41%대의 초고마진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9개월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19억 유로를 넘기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버킨·켈리 중심의 ‘핵심 카테고리’가 꾸준히 매출을 견인했고, 공급량을 통제하며 브랜드 희소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에르메스가 경기 둔화·환율 변동·지역별 소비 차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필요해서 사는 소비’가 아닌 ‘사고 싶어서 기다리는 소비’를 만들어낸 덕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 에르메스는 흔들림 없는 절대 강자, 그리고 초고가 시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LVMH는 또 다른 방식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약 398억 유로, 영업이익 90억 유로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둔화가 있었음에도 그룹 전체는 여전히 산업 내 가장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있습니다. 9개월 누적으로는 매출이 581억 유로를 넘어서며 하반기 회복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루이비통·디올은 가격 인상과 꾸준한 신제품 주기가 잘 맞아떨어졌고, 지역별로는 미국 소비가 둔화된 대신 유럽 관광 수요와 중동·동남아 수요가 이를 받쳐주었습니다. LVMH의 강점은 결국 특정 국가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방대한 포트폴리오이며, 이 구조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빛을 발합니다.
반면 구찌를 포함한 케링 그룹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분기 기준으로 케링 전체 매출이 약 34억 유로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구찌는 같은 기간 약 13억 유로 매출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 리뉴얼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교체가 진행 중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정체성과 디자인 방향성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소비자 이탈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중국 소비 둔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럭셔리 시장이 양극화될수록 ‘브랜드 파워’는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구찌는 딱 그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급 브랜드들의 실적도 브랜드의 체력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Burberry는 최근 분기 기준 매출이 약 4억 파운드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정체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고가 라인에 집중한 전략이 오히려 가격 경쟁력과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결정적으로 브랜드만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장 회복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같은 중간급 프리미엄 카테고리 내에서도 Bottega Veneta는 Burberry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ottega Veneta는 케링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으며, 과거 대비 매출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시즌마다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강하고, 특정 연령대보다는 다양한 고객층에서 고른 수요가 나타나는 점이 장점입니다. 물론 초고가 브랜드만큼의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불황기에도 안정성을 갖춘 브랜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Burberry처럼 디자인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브랜드와 달리 이미 확고한 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반등 여지는 더 높습니다.
이처럼 브랜드별 실적 차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중국과 함께 글로벌 럭셔리 소비의 핵심 시장으로 자리잡았고, 2030 소비층의 고가 소비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셀·커뮤니티·SNS 기반의 가치 형성 방식이 활발하다 보니 브랜드 파워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품’ 또는 ‘럭셔리 ETF’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브랜드별로 소비자 심리·가격 정책·브랜드 정체성·국가별 매출 비중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앞으로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 현재 글로벌 럭셔리 시장은 분명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에르메스와 LVMH처럼 절대 강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세는 오히려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구찌·Burberry처럼 브랜드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시장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은 구조적 조정에 더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은 단기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1등 브랜드 중심의 독식 구조’가 굳어지는 장기적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럭셔리 투자는 브랜드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라, 각 기업의 실적·브랜드 전략·정체성·고객 기반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와 글로벌 경기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럭셔리시장 #에르메스 #루이비통 #LVMH #명품시장 #구찌 #케링 #버버리 #보테가베네타 #럭셔리양극화 #브랜드전략 #초고가시장 #하이엔드소비 #유럽명품 #중국명품시장 #미국소비트렌드 #2030소비 #럭셔리투자 #패션산업트렌드 #리치플랫폼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