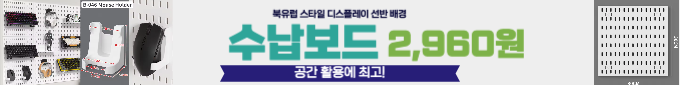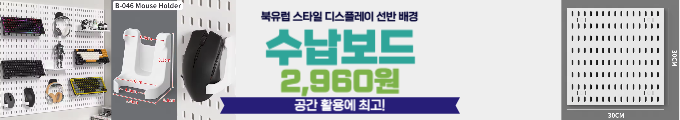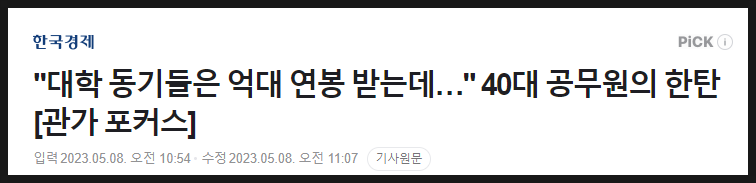
명문대를 졸업한 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관가에 입성한 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박탈감은 상당하다. 통상 행시에 합격한 후 12~15년은 지나야 서기관을 달게 된다. 정부 부처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인사 적체가 심한 기재부에선 40대 중반의 공무원이 보직 과장을 맡는 것도 흔치 않다.
대학 동기들이 행시 대신 로스쿨을 선택해 변호사가 되면서 고연봉을 받는 것도 사무관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기재부는 통상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들이 행시 재경직에 합격한 후 입직하는 대표적인 ‘정통 코스’였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행시 재경직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엔 우수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IB 등 금융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사무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40대 후반이면 민간 대기업에선 임원을 다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억대 연봉을 받는 민간 대기업 임원과 비교하면 4급 공무원은 5580만원(15호봉 세전 기준)에 불과하다.
중앙부처 간부들이 국제기구 등 해외 근무를 선호하는 것도 해외 경험을 쌓는 것을 넘어 기타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봉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부처 과장급 간부인 A씨는 “자녀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호봉이 쌓여도 임금 인상률이 낮아 형편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렇다 보니 요새는 타고난 ‘금수저’ 출신 공무원들만 보수 걱정 없이 일에만 몰두한 덕분에 조기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후문까지 들린다.
---------------------------------------------------------------------------------------------------------------------------------------------------
일반 공무원(9급, 7급)이 아닌
5급 공무원을 말하는듯 합니다.
그중에서도 재경직(기재부, 산업부)공무원
재경직 행시는 정말 문과의 '꽃'이었죠.
문과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잘한다는걸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증빙 같은거...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5급 공무원으로 일하는것보다
금융권에 진출하는게
소득면에서 2배 이상이나 이익이고,
+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국가공무원은 세종시 근무)
'돈'이 목적이라면
더이상은 공무원을 하면 안될거 같은 시대구요.
집이 빵빵한 일명 금수저나 귀족출신인 사람만
'엘리트 관료'를 넘볼 수 있을듯 합니다.
집 가난한데
머리좋고 학벌좋은 문과생에게
더이상 행시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생계 걱적을 해야 하는
고위공무원들은 조기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재취업해서
억대 연봉받는게
급선무일테고,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엘리트 관료 자리는 '가진 자'들의 자리로
굳어지겠죠.
기시다 총리도 3대째 정치인을 해먹고 있죠...
재경직 공무원보다
한의사가 최고다!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