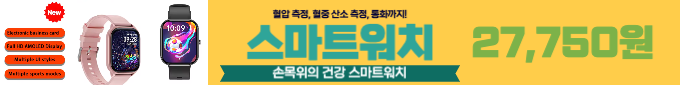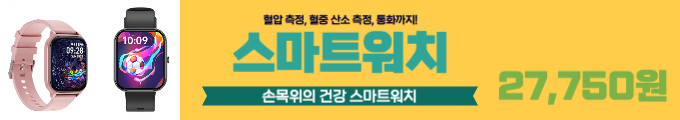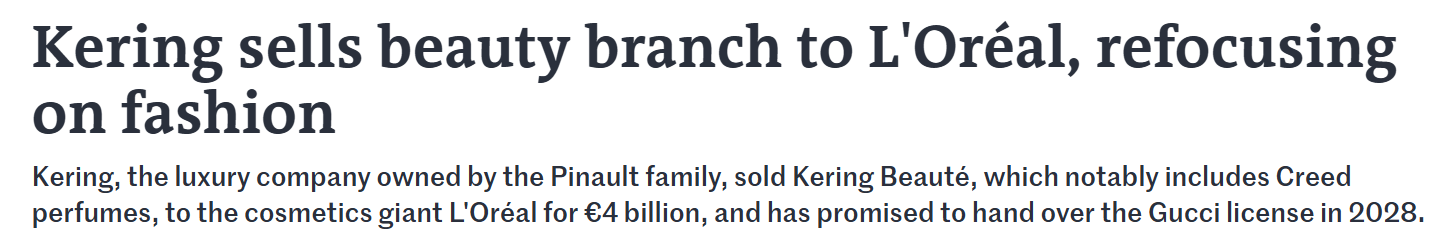
세계 뷰티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수·화장품·럭셔리 뷰티 브랜드를 둘러싼 경쟁은 단순한 제품 전쟁을 넘어, 브랜드 군집화, 라이선스 구조, 플랫폼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럭셔리 그룹 케링이 자사 뷰티 유닛을 로레알에 매각하며 양사가 대규모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딜은 단순한 M&A가 아니라 뷰티 산업 전체의 성장 궤도와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패러다임 변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케링이 보유했던 뷰티 축은 2023년 향수 브랜드 크리드(Creed)를 인수한 뒤 ‘케링뷰티(Kering Beauté)’라는 이름으로 구축된 비교적 새로운 사업입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뷰티 사업을 인하우스로 키워 나가는 흐름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케링의 시도는 그만큼 과감했고 리스크도 컸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19일, 케링은 자사의 뷰티 단위를 로레알에 매각하고 50년간 자사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향수·뷰티 라이선스를 로레알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딜 규모는 약 40억 유로(46억 달러) 수준이며, 향후 양사는 웰니스와 롱제비티(지속가능한 건강) 분야에서도 합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딜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로레알이 이미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로레알은 115년의 역사 동안 13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2024년 매출이 435억 유로를 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메이블린, 랑콤, 키엘, 비오템 등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중·프리미엄·럭셔리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번 딜은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초럭셔리 향수·뷰티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반면 케링은 구찌(Gucci), 생로랑(Saint Laurent),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발렌시아가(Balenciaga) 등 유명 브랜드를 거느린 세계적 럭셔리 그룹입니다. 가죽제품·패션사업에서 높은 수익을 내왔지만, 뷰티 영역에서는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구찌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그룹의 부채가 늘어나며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해진 것도 결정적 배경입니다. 새로운 CEO 루카 데 메오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자”는 전략 아래 뷰티 사업을 매각했고, 이를 통해 95억 유로에 달하는 순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딜 발표 직후 케링 주가는 하루 만에 5% 가까이 상승했고, 로레알 역시 향수와 럭셔리 뷰티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장은 이 거래를 “럭셔리 산업의 축이 패션에서 뷰티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산업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브랜드 라이선스 구조의 본격화입니다. 케링이 보유한 구찌,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등 럭셔리 브랜드의 향수·뷰티 부문 라이선스가 앞으로 50년 동안 로레알로 이전됩니다. 이는 명품 브랜드가 직접 제조·판매를 하는 대신, 생산·유통·마케팅을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브랜드는 이미지 관리와 크리에이티브에 집중하고, 로레알은 이를 대규모 유통망과 R&D 기술로 상업화합니다.
둘째, 초럭셔리 향수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전 세계 향수 시장은 연평균 7% 이상 성장 중이며, 2030년에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5%의 소비층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레알이 크리드 브랜드를 확보한 것은 바로 이 초고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크리드는 1병당 40만 원이 넘는 향수로 알려져 있으며, 브랜드 충성도와 재구매율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뷰티 산업의 중심이 ‘제품’에서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케링과 로레알은 이번 제휴를 통해 단순 화장품 제조가 아닌 ‘브랜드 문화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확장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색조나 향보다 브랜드가 주는 감정적 경험과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뷰티가 곧 라이프스타일이자 문화가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로레알은 이번 인수로 “초럭셔리 뷰티의 플랫폼”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케링은 패션·가죽제품에 다시 집중하며 그룹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이번 딜은 뷰티 산업이 브랜드 하우스와 플랫폼 기업으로 분화되는 분기점이자, 글로벌 럭셔리 산업의 세력 재편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뷰티 시장의 현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뷰티 산업은 현재 6,3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5~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셀프케어” 트렌드와 함께 스킨케어·향수·프리미엄 화장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화두는 ‘럭셔리의 대중화’와 ‘K뷰티의 부상’입니다. 유럽의 뷰티 하우스들이 기술 혁신과 AI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제품을 내놓는다면,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은 감각적인 마케팅과 빠른 제품 주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K뷰티는 더 이상 아시아 한정 트렌드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약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프랑스·미국에 이어 세계 3위 뷰티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스킨케어와 색조 부문에서의 기술력은 글로벌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비건, 클린뷰티, 기능성 앰플, 듀얼 텍스처 포뮬러 등은 이제 한국 브랜드의 전유물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K뷰티 브랜드로는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와 설화수, LG생활건강의 후(Whoo),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비디비치,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그리고 신흥 강자인 딥티크코리아(연작) 등이 있습니다. 라네즈는 ‘워터뱅크’ 라인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세포라 입점을 확대하며 글로벌 매출을 끌어올렸고, 설화수는 중국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의 ‘후’는 지난해 중국 왕홍 마케팅을 넘어 미국, 중동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산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향·패키징 디자인·브랜드 스토리텔링 모두 현지 소비자와의 정서적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비디비치는 “K뷰티의 럭셔리화” 전략으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저가형 한류 화장품이 아니라, 패션·뷰티 융합형 브랜드로서 글로벌 바이어들의 눈에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전용 프리미엄 라인을 런칭하며, 한국 브랜드 최초로 북미 뷰티 리테일러 ‘얼타(ULTA)’에 입점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MZ세대가 한국 브랜드를 “새롭지만 접근 가능한 럭셔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전통 뷰티 브랜드가 헤리티지와 품격을 상징한다면, 한국 브랜드는 혁신·속도·감각적 디자인을 상징합니다. 제품력은 이미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K-뷰티의 세련됨’은 새로운 글로벌 미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레알–케링 딜이 상징하는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K뷰티의 존재감은 독특한 균형을 이룹니다. 거대 그룹이 브랜드 라이선스를 사고파는 시대에, K뷰티는 오히려 브랜드 정체성과 창의성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견 브랜드들은 외부 라이선스 계약 없이 자사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있으며, ‘스스로 만든 브랜드로 세계와 경쟁하는 모델’이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뷰티 콘테스트 ‘뷰티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3년 연속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토니모리·클리오 등은 유럽 약국 체인과 파트너십을 통해 온라인 유통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의 제조 기술력, 빠른 제품 사이클, 감성적인 브랜딩이 동시에 통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과학적인 동시에 감성적인 브랜드”를 원하고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K뷰티는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조차 흉내 내기 어려운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K뷰티는 단순한 카테고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뿐 아니라 향, 헤어, 바디케어, 남성 그루밍 등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뷰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중동·유럽 시장에서는 “한국산 화장품=신뢰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로레알과 케링이 보여준 이번 거래는,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럭셔리 뷰티 시장의 재편인 동시에, ‘작지만 강한 브랜드’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로레알이 브랜드를 흡수하는 동안, K뷰티는 브랜드 정체성과 스토리텔링으로 시장의 빈틈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뷰티 산업은 단순히 누가 제품을 잘 만드는가보다, 누가 더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로레알은 기술과 자본을 무기로, 케링은 문화와 감성으로, 그리고 K뷰티는 혁신과 진정성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 구도는 한층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로레알이 케링의 초럭셔리 브랜드를 통해 향수 시장을 재편하는 동안, K뷰티는 디지털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협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크기가 아닌 ‘진정성’이 성공을 결정짓는 시대, 로레알의 규모와 K뷰티의 속도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뷰티는 이미 단순한 향과 색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문화·기술·정체성이 뒤섞인 거대한 예술 산업이 되었습니다. 로레알과 케링이 그 판을 설계한다면, K뷰티는 그 판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레알 #케링뷰티 #구찌뷰티 #크리드 #K뷰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설화수 #라네즈 #후 #비디비치 #글로벌뷰티산업 #향수시장 #럭셔리뷰티 #웰니스 #롱제비티 #AI뷰티 #한류뷰티 #프리미엄향수 #뷰티트렌드 #한국브랜드 #K뷰티성장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