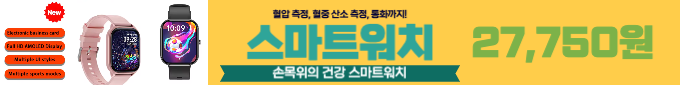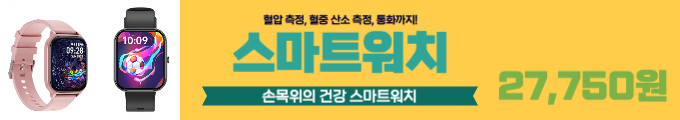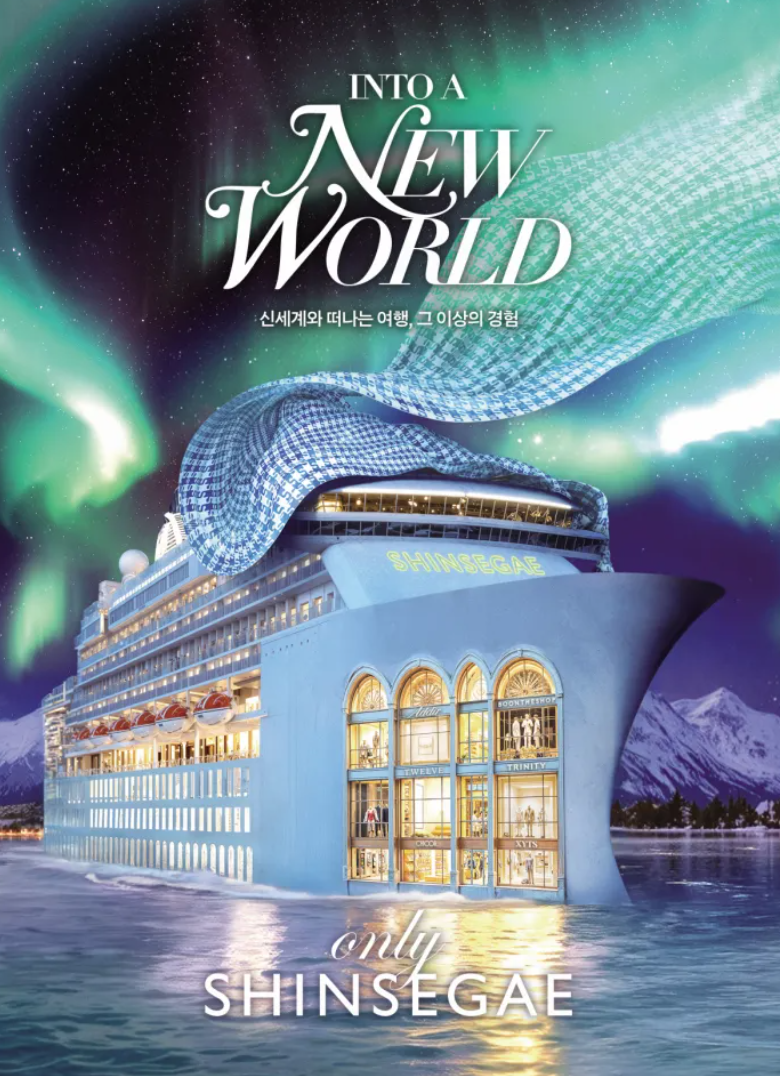
요즘 ‘비아신세계’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非)아신세계’가 아니라, ‘비(非) 신세계’ — 즉, 신세계백화점의 ‘물건 소비’를 넘어 ‘경험의 신세계’를 지향하는 흐름을 일컫는 말로 쓰이죠. 쉽게 말해,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샀느냐’보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물건을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아신세계’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만큼, 공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품보다 ‘체험’을 중심으로 공간이 설계되고, 브랜드는 ‘무엇을 파는가’보다 ‘어떤 감정을 주는가’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더현대 서울’이나 ‘더서울라이티움’, 그리고 한남의 ‘피크닉’ 같은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자 콘텐츠입니다. 단순히 옷을 보러 간다기보다, ‘공간의 감도’를 느끼고 ‘분위기를 소비’하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천장을 올려다보는 그 순간조차도 ‘소비 행위’로 바뀌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건 MZ세대입니다. 이들은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며, SNS를 통해 그 경험을 공유하는 데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여행지의 뷰, 레스토랑의 분위기, 갤러리의 조명 —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브랜드’가 되고, 소비는 곧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확장됩니다.
‘비아신세계’는 이런 세대의 소비 코드가 만들어낸 신조어이자, 자본이 감정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의 소비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소비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단지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법’을 사는 것이죠.
기업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럭셔리 브랜드들은 ‘스토어’가 아닌 ‘하우스(하우스 오브 브랜드)’를 표방합니다. 루이비통의 ‘LV 드림’, 구찌의 ‘구찌 가옥’, 샤넬의 ‘레베쥬 하우스’ 모두가 물건 판매보다 ‘브랜드의 세계관’을 체험시키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역시 이런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비아신세계’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큐레이션하고, 고객의 일상을 감각적으로 확장시키는 ‘체험 브랜드’를 지향합니다. 단순히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가 아니라, ‘공간 그 자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든다’는 점에서, 신세계는 ‘공간 미디어 기업’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소비’는 앞으로 더 세분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도 단순히 맛이 아니라 ‘공간과 음악, 사람과의 거리’까지가 브랜드가 되고, 공연 역시 스토리보다 ‘현장감’을 파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의 본질이 ‘무엇을 소유하느냐’에서 ‘무엇을 느꼈느냐’로 이동하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비아신세계’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흐름은 투자와 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예고합니다. 백화점은 ‘체험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브랜드는 ‘경험을 설계하는 회사’로 진화합니다. 나아가 AI와 데이터 분석은 각 개인의 취향과 감정 상태를 기반으로 ‘맞춤형 경험’을 제안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예를 들어, 사용자의 SNS 데이터에서 선호 패턴을 읽고, 그에 맞는 전시나 공간을 추천해주는 AI 큐레이터가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아신세계’는 단순한 마케팅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의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선언이자, 감정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무엇을 살까’보다 ‘어떤 순간을 남길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세대 — 그들이 바로 ‘비아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아신세계 #경험소비 #신세계 #MZ세대소비트렌드 #체험경제 #공간마케팅 #더현대서울 #구찌가옥 #루이비통드림 #라이프스타일브랜딩 #소비의진화 #감정의자본 #리치플랫폼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