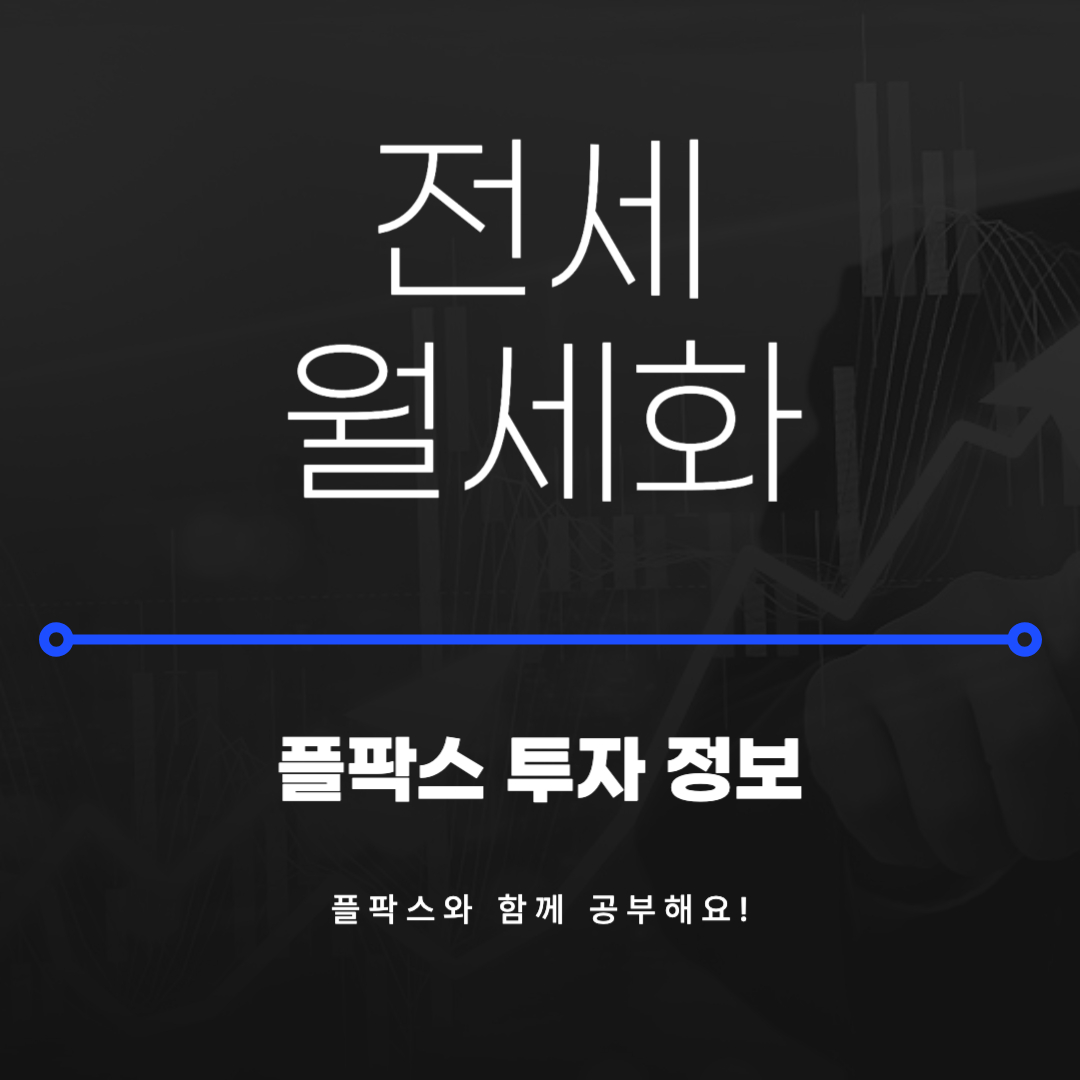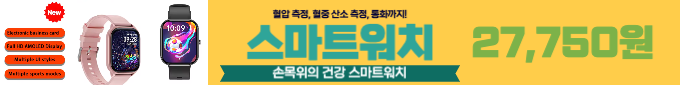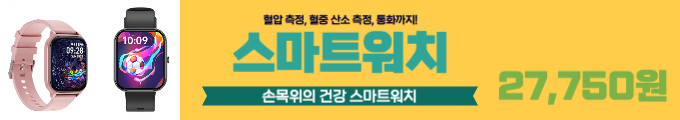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 대책인데,
이번에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을 모조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매매 시장은 사실상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실종' 수준으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매수 문의 자체가 끊겼고, 그나마 있던 대기 수요마저 완전히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대책이 강력한 이유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10월 20일 발효)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해당 지역의 아파트 등을 사려면 계약 전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문제는 매매 시장의 숨통을 조이자, 그 압력이 고스란히 전·월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전세의 월세화' 가속입니다. 정부는 대출 문턱도 대폭 높였습니다.
특히 그간 규제에서 비켜가 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마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켰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연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으면 DSR 비율이 14%나 반영되어 다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치솟은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나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3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월 대비 7.4%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공급 전망도 암울합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 1만 7천여 가구에서 2028년에는 8천여 가구 수준까지 급감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서울 전역이 규제로 묶인 상황에서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쳐 전·월세 물건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축소되고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결국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 현실화될까 우려됩니다.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