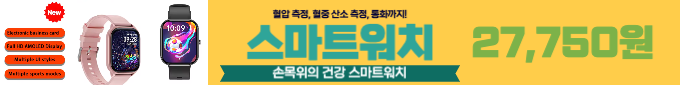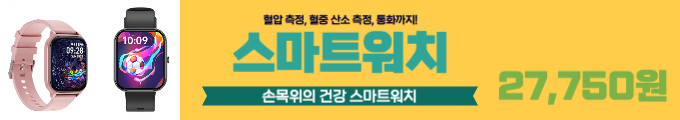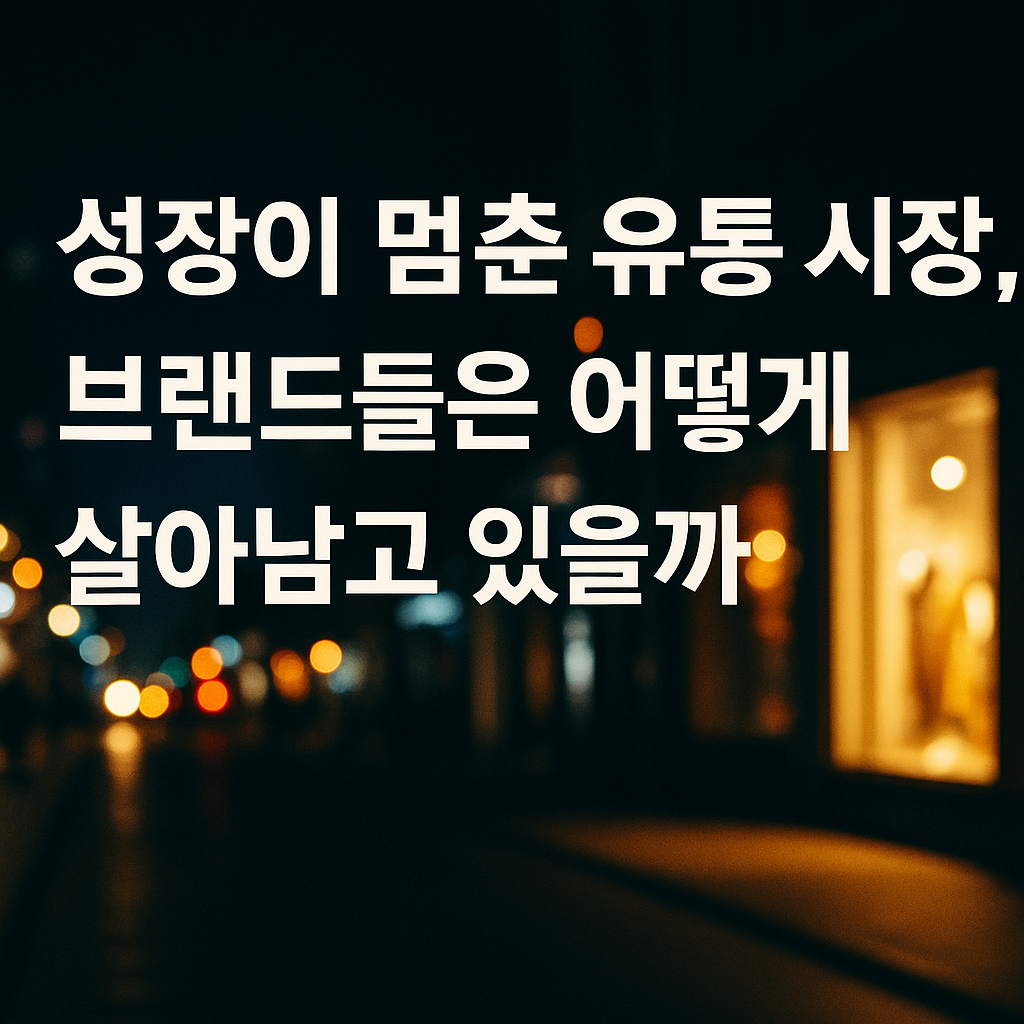
유통 시장은 늘 “성장”을 전제로 움직여왔습니다. 매출은 해마다 오르고, 점포 수는 늘어나고, 소비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 믿어왔죠.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 상반기, 국내 소매 유통 시장은 사실상 ‘제로성장(0%)’을 기록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까지 모두 예전만큼의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 국면 속에서 일부 브랜드들은 오히려 역성장을 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고 있을까요?
2025년 유통 시장을 대표하는 단어는 단연 ‘정체’입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상반기 주요 유통업종의 매출 증가율은 평균 0.4%에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성장입니다. 대형마트는 -2.3%, 백화점은 1%대의 미미한 성장, 편의점은 3~4% 정도의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커머스(온라인) 부문도 이제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유통업 전체가 한계점에 부딪힌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로성장’ 시장 속에서도 매출을 늘리고 있는 브랜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채널의 확장’이 아니라 ‘관계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브랜드의 팬덤화 전략이 돋보입니다. 성장은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팔아서가 아니라, 기존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신사입니다. 무신사는 단순한 패션 플랫폼이 아니라, 고객이 브랜드의 일부가 되는 ‘커뮤니티형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제품 리뷰를 남기고, 코디를 공유하며, 브랜드 신상 소식을 직접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런 ‘참여형 유통’은 광고비를 줄이고도 자연스럽게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고객이 브랜드의 팬이 되면, 구매는 ‘행위’가 아니라 ‘응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체험 중심의 오프라인 리뉴얼이 활발합니다.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영은 단순한 뷰티 편집숍에서 벗어나 ‘K-뷰티 체험 허브’로 리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 플래그십 매장은 해외 관광객을 위한 뷰티 체험존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메이크업 클래스를 진행하거나 인기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오프라인 콘텐츠 스튜디오’ 역할을 합니다. Z세대에게 매장은 쇼핑이 아니라 ‘인증할 만한 공간’이 된 것이죠. 즉,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아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무대로 진화한 셈입니다.
셋째, AI와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가 유통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추천 알고리즘이 있었다면, 이제는 고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그때그때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의 ‘개인 맞춤형 추천’은 이미 익숙하지만, 최근에는 백화점과 편의점도 이 영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AI 기반 CRM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방문할 때마다 구매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직원 태블릿에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GS리테일은 고객이 자주 찾는 시간대와 상품을 AI가 학습해, 진열 순서와 재고 관리까지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결국 ‘상품 중심’의 유통이 ‘고객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로컬 기반의 미니 채널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 단위로 물류를 깔고 TV 광고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역 3km 반경’이 유통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의 ‘B마트’, GS의 ‘도심형 마이크로 물류센터’, 이마트24의 ‘동네 픽업존’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도심형 물류센터(CFC)는 주문 즉시 1~2시간 내 배송이 가능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류 혁신이 곧 마케팅인 셈입니다.
다섯째, 지속가능성(ESG)을 유통 전략에 녹이는 브랜드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보호가 아니라,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에 맞춘 ‘브랜드 신뢰 전략’입니다. 스타벅스는 리유저블 컵 캠페인으로 소비자 참여형 ESG를 구현했고, 현대백화점은 친환경 브랜드만 모은 ‘리사이클 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30대 소비자는 “이 브랜드가 나의 가치와 맞는가”를 구매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제 상품의 품질만큼이나, 브랜드의 철학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유통업은 어디로 향할까요? 결국 ‘규모의 성장’에서 ‘깊이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 명의 고객이 열 번 구매하는 것이, 열 명의 고객이 한 번 구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유통 기업의 핵심 자산은 점포나 물류창고가 아니라, 고객 데이터와 관계 자본(Relationship Capital)이 됩니다. AI 기술을 단순히 자동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고객 감정을 읽고 연결하는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고객 관계 유지율(retention rate)을 KPI의 중심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은 ‘로켓와우’ 멤버십 재가입률을,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재방문율’을, 백화점은 ‘VIP 고객 1인당 연간 구매액’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 브랜드만이 살아남는다.”
유통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통사는 새로운 고객을 찾는 대신,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 깊게 쌓습니다. 매장을 재설계하고, AI를 도입하고, 데이터를 읽고, 가치 중심의 브랜드 문화를 만듭니다. 이제 유통의 핵심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랑받느냐’입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 결국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속도가 아닌 진심입니다.
#유통혁신 #제로성장 #리테일트렌드 #AI유통 #브랜드전략 #오프라인리뉴얼 #ESG브랜드 #고객경험 #참부 #한국유통 #무신사 #올리브영 #쿠팡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