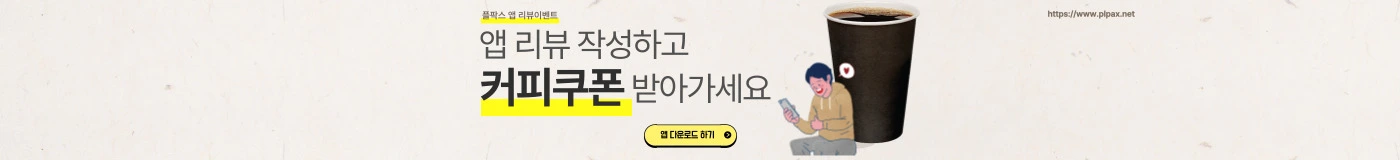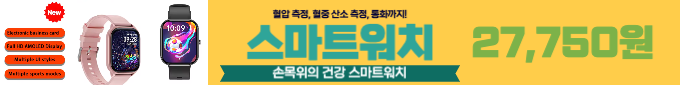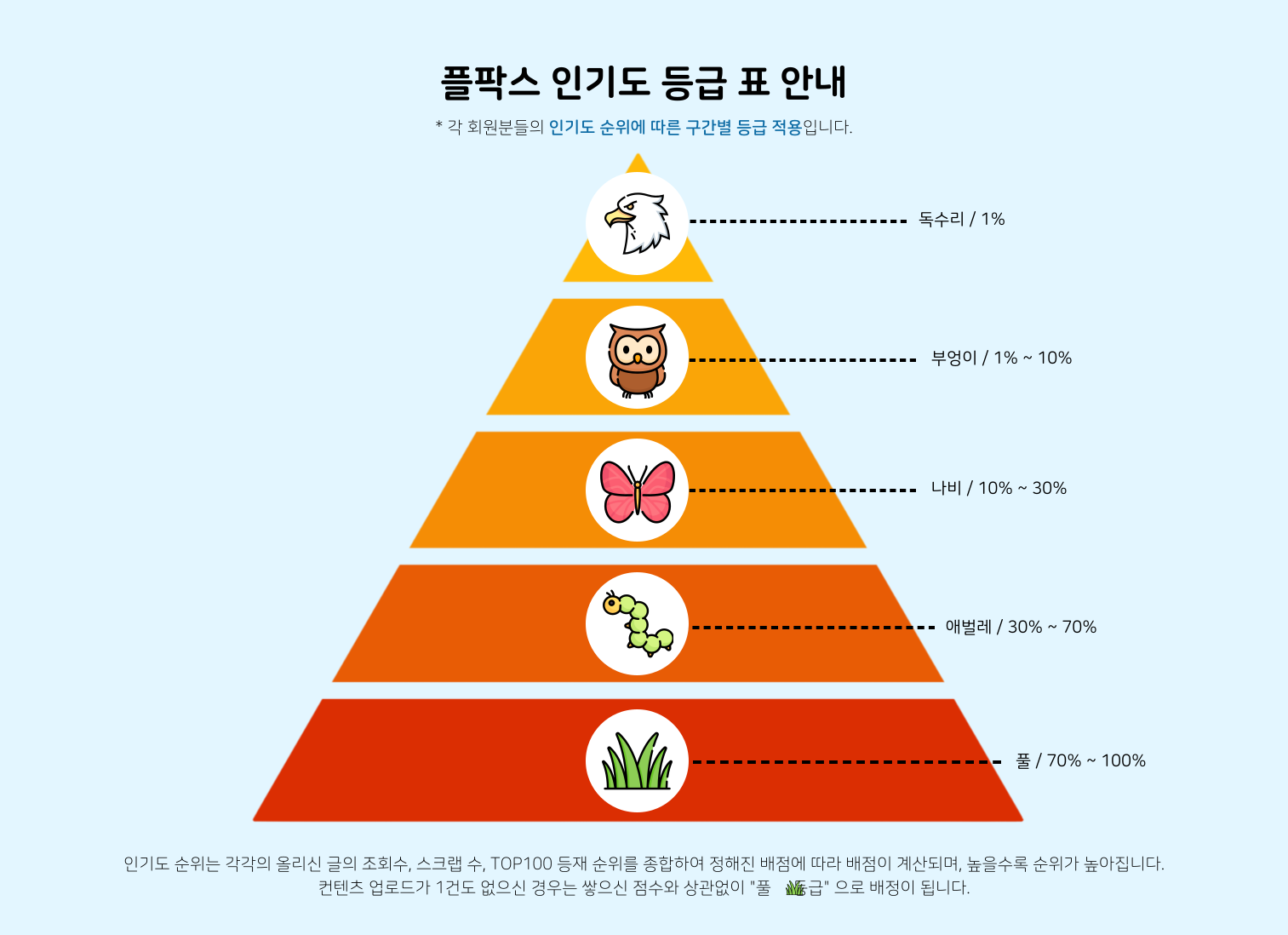버핏 지수(Buffett Indicator)
버핏 지수는
한 나라의 주식시가총액 ÷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의미하며,
워런 버핏이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가 100%를 넘으면
주식시장이 GDP 대비 과대평가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
.
.
.
미국의 경우
IT 버블 당시 버핏 지수가 150%를 넘어섰고,
금융위기 직전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AI·테크 기업 주가 급등으로
다시 170%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시장 과열” 논란이 커졌습니다.
.
.
.
.
반대로 코로나 위기 직후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이 지수가 낮아져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과 GDP를 비교했을 때,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는
버핏 지수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저평가 구간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버핏 지수는 단순화된 지표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GDP 규모 대비 주식시장 비중이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를
(예: 미국은 상장사 비중이 높고, 독일은 낮음)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장 산업 비중, 금리 수준,
글로벌 자금 흐름까지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 지수는
시장의 큰 그림을 보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과열인지, 저평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지표입니다.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