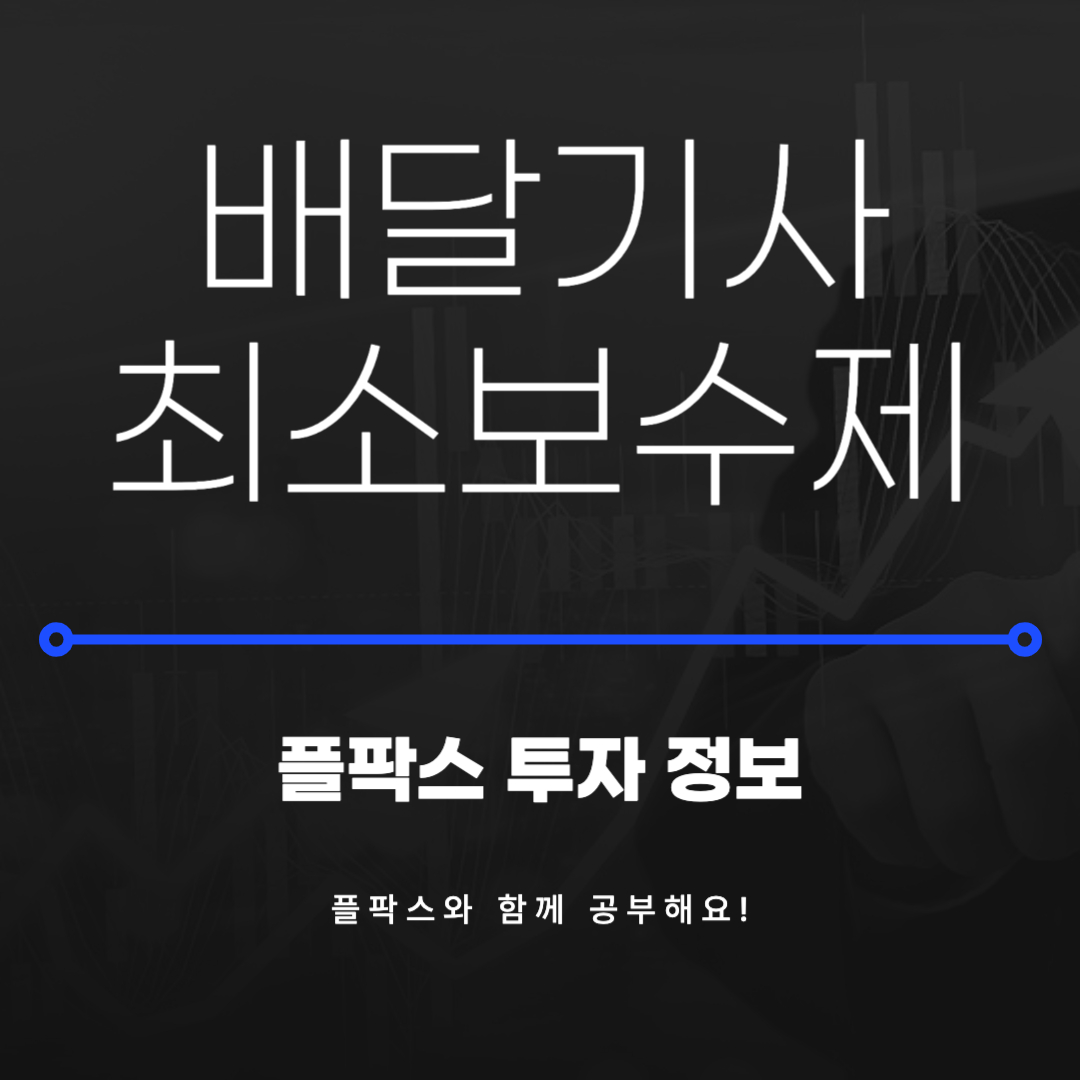"뉴욕 이어 한국도?"⋯배달 라이더 '최소보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추진에 이어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흐름인데요. 업계에서는 비용 전가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소보수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 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노동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운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테이블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고려한 바 있습니다.
이번 최소보수제 논의는 이러한 정책 흐름과 맞물려 추진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임금 최저선으로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최소보수제는 배달, 대리운전처럼 법적 근로자 지위가 없는 이들을 위해 시간당이나 건당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논의는 제도 설계의 초기 단계입니다. 시간 기준 보수와 건당 보수를 혼합하는 방식, 대기시간을 포함할지 여부,
유류비와 보험료 같은 자부담 비용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앱 환경에서 보수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2023년부터 배달노동자에게 최소보수를 보장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기준 시간당 21.44달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애틀도 앱 기반 노동자 최소지급 조례를 시행 중이고, 호주 역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법으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보수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장님'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돼 왔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소득도, 복지 혜택도 없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단순히 임금을 올려주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플랫폼 기업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사회적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 기업, 노동자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만 제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컨텐츠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