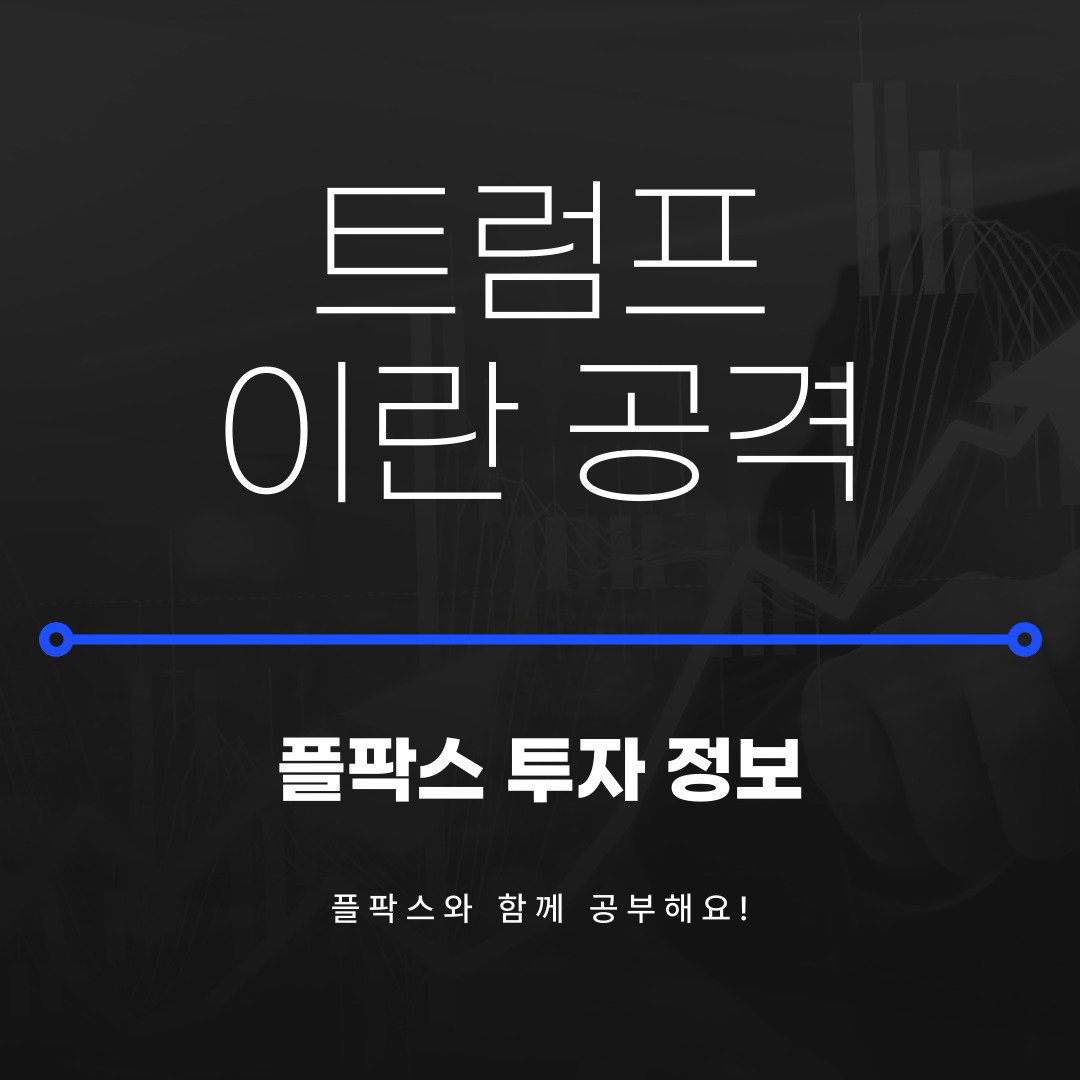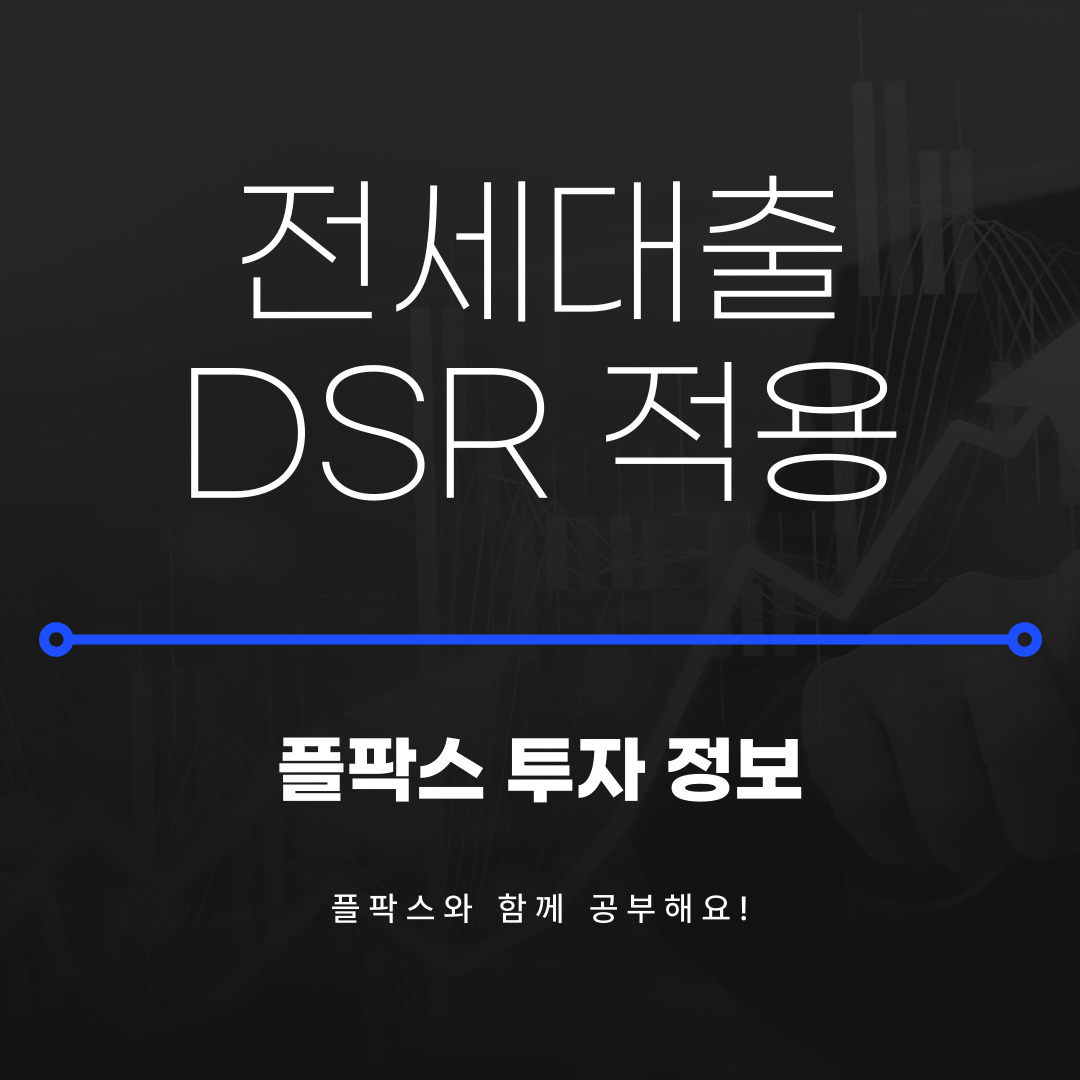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전세대출과 정책 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비규제 영역으로 남아 있던 대출들을 포함시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어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DSR이란 대출자가 1년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의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 기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세대출과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받아 왔다.
이러한 대출은 특히 갭투자나 무리한 주택 매입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전셋값과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정책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전세대출과 정책 대출을 포함한 전체 부채의 총량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DSR 적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를 확대하면 취약계층이 주거를 더 어렵게 마련하게 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만약 DSR 규제가 전세대출에도 적용된다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대출 심사 요건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고,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심사가 강화되고,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금융 접근성은 낮아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경제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세대출 DSR 포함 논의는 가계 건전성과 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정책적 딜레마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
향후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서민 주거 금융 정책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금융 소비자들의 철저한 정보 확인과 대출 전략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컨텐츠
컨텐츠